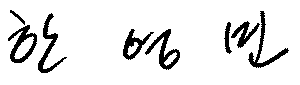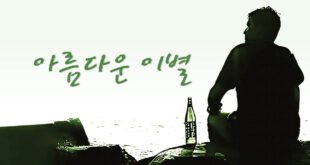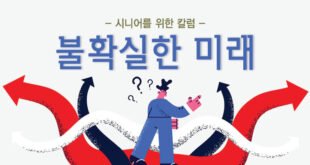처음 베트남이 와서 베트남 언어를 조금 익히면서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không 과 chưa 라는 의문 접미사가 붙습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형식이죠, 우리는 ~니? ~까? ~요? 라는 종결어미에 억양을 높이는 것으로 의문문을 만듭니다.
그러나 중국어나 베트남어 같이 성조가 있는 언어에는 그런 식으로, 억양을 높이는 것만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억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조 언어에는 간단하게 의문 접미사를 만들어 붙여 의문문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의문문을 나타내는 의문 접미사가 베트남에서는 không 과 chưa이고 중국에서는 “吗” ma 가 됩니다. 태국은 ไหม (mai?) 라오스는 ບໍ (bo?) 미얀마는 လား (la:)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 접미사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접미사이지만, 베트남이 갖고 있는 không 과 chưa 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모두 부정적 의미라는 것이 다른 국가와 다릅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긍정적 의문문을 사용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문법적으로는 부정적 의문문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일단 그 의문 접미사인 không 과 chưa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Không 은 영어의 no 와 같은 단어입니다. Chưa 는 영어의 yet 과 같이,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밥 먹었어? → Bạn đã ăn chưa? → 밥 아직이야?
▶ 일 마쳤나요? → Bạn đã xong việc chưa? → 일 아직 못 마쳤어?
▶ 집에 갔어? → Bạn đã về nhà chưa? → 집에 아직 도착 안 했나?
▶ 건강합니까? → Bạn có khỏe không? → 건강 안 한 건 아니죠?
굳이 베트남어를 다시 한국어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부정적 질문 형식이 됩니다. 의문 접미사에 부정의미가 담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트남인의 정서를 조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지 않는 거지요. 상대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문법의 의문문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담겨 있습니다.
Bạn ăn cơm chưa?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을 하면 답은 yes 나 no 가 아니고 rồi 혹은 chưa로 답하지요. 더 이상 대화가 종결되는 예, 아니오가 안 나옵니다.
또 다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요. 자신은 질문을 하고 답에 대한 권한은 철저히 상대에게 이양시키며 상대를 존중합니다.
한국어처럼 분명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는 은근한 여운을 남긴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배려와 관심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도로 부정적 의문 접미사를 사용하는 듯합니다. 동시에 표현의 불확정성으로 다툼을 피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완곡함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어적 관습이 주는 그늘 또한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직(Chưa)라는 말에는 분명한 자신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형식에는 직접적인 의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애둘러 말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인상도 받습니다. 질문만이 아니고 대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대답에도 예, 아니오를 쓰지 않습니다. 뭔가를 거절할 때도 절대로 không (아니요)이라는 단어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로 Chưa를 사용하여 애매하게 답합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chưa nghĩ xong)” “아직 시간이 안 돼(chưa có thời gian)” “아직 잘 모르겠어(Chưa biết nữa).” 등으로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Chưa 가 주는 완곡하지만 분명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그가 Chưa 로 답했다면, 그건 거절의 뜻임을 감지해야 합니다. 아, 아직인가 보다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다시 물으면 그 사람은 속으로 “아니 이미 답했는데 또 자꾸 묻지 하며” 더 실망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충청도 기질과 유사합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여지를 남겨두는 관습에 익숙한 것입니다. 쉽게 확정적으로 말하다가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의도이고, 전쟁과 식민지 역사를 겪으면서 익힌 생존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이러한 언어적 관습을 만나면서 여러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은근한 여유와 배려, 동시에 애매함과 답답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들의 삶의 깊이에 담긴 빛과 그림자를 다 보는 셈입니다.
언어는 그 사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거울을 통해 베트남의 Chưa 가 주는 은근한 삶의 온기와 서두르지 않는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역사의 그늘을 동시에 들여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