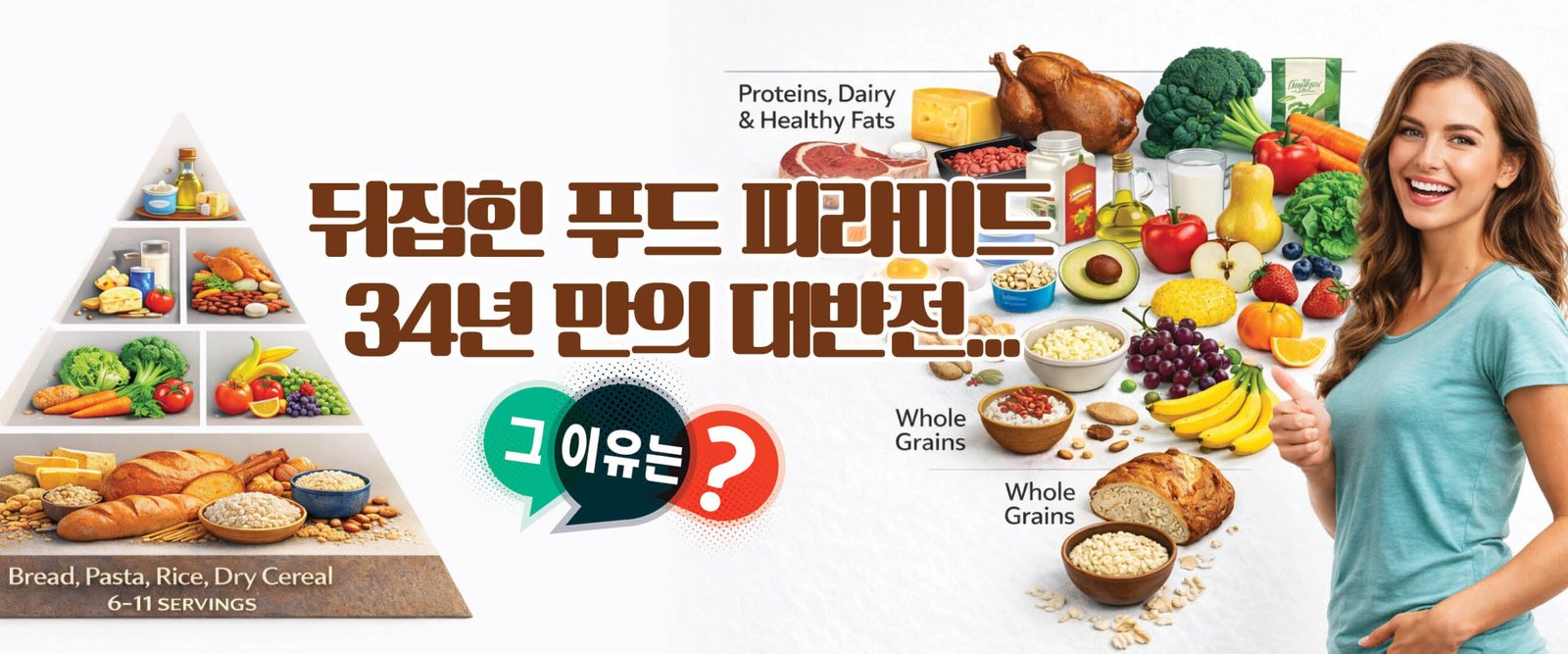베트남으로 오고 있는 중국 외식산업
과연 이들은 누구인가?
중국 외식 브랜드들이 전 세계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그 규모와 성장세는 가히 압도적이다. 2024년 기준 중국 훠궈(火鍋) 전문 브랜드 하이디라오(海底撈, Haidilao)의 글로벌 매출은 약 7조8000억원에 달하며, 전 세계 14개국에 1,300여 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용가훠궈(勇哥火鍋)의 본사인 웰리스 그룹(Wellis Group)은 중국 내에서만 2만5000여 개의 직영 점포를 운영하며, 2024년 연 매출 8조원, 전 직원 수 19만명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밀크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차백도(茶百道, ChaPanda)의 ‘말리 라떼’ 연간 판매량은 1억1000만컵, 중국 내 밀크티 점포는 50만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미쉐빙청(蜜雪冰城, Mixue)은 전 세계 4만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34억5000만 홍콩달러를 조달하는 등 외형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다. 텐센트(Tencent), 딥시크(DeepSeek) 등 IT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외식 브랜드들은 장기적인 시야와 단계별 전략으로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 관계의 일반적 프랜차이즈가 아닌 ‘공동 지분형 직영 체인’, 2년 단기 임대가 아닌 5~10년 장기 임대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리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낸 상태다. 운영 시스템, 디자인,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급성장하는 중국 외식 브랜드들의 저력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 글로벌 진출의 시금석이 되다
중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다. 반티엔야오 카오위(半天妖烤魚)의 남철지 대표는 “중국 외식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온 것은 2014년 하이디라오(海底撈)부터”라고 설명한다. 이전에도 몇몇 중국 브랜드가 들어왔으나 대부분 개인 또는 소규模 외식 브랜드였으며, 현지화 실패, 경쟁 심화, 위생 문제 등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외식 브랜드들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MZ세대 소비자가 많아졌고, 중국 외식 브랜드들도 고도화된 운영 디테일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버티고 이겨낸 곳만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에 시스템, 디자인, 서비스 등의 경쟁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용가훠궈(勇哥火鍋) 김정걸 대표는 한국 시장 진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 내 과포화된 시장을 벗어나 해외에서의 기회를 찾고 있다. 운영 매뉴얼 표준화를 완성한 기업들 중 훠궈와 밀크티를 메인 메뉴로 하는 곳이 많다. 한국 내 중국인만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들이 찾는 브랜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규모가 필요하다.”


한국 시장이 중국 외식 브랜드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명확하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외식산업 규모는 110조8000억원이다. 중국 외식산업 규모가 1000조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5100만명의 한국 인구와 14억명의 중국 인구는 27배 차이가 나지만, 외식산업 규모는 10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구매력이 높은 시장인 셈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식품안전기준이다. 해외 식품을 한국에 수입할 때의 식품안전기준은 세계적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전 안전성 심사, 서류 심사, 필요 시 현지 실사를 거쳐야 하며, 제조 업체 및 제품 등록, 검사 및 검역 의무, 수입 위생 평가 등 여러 단계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과 3년마다 위생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다.
한국 시장 진출이 확정되면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또한 한국에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어 외식 브랜드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다. K-컬처와 K-푸드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한국 시장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 긍정적 이미지까지 덧씌워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국 훠궈 전문점과 밀크티 브랜드들이 한국 내 점포 오픈을 시작으로 동남아 및 글로벌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동 지분형 직영 체인
중국 외식 브랜드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독특한 프랜차이즈 경영 모델에 있다. 중국 내 프랜차이즈 경영모델은 직영 체인, 특허 체인, 자유 체인 3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직영 체인과 특허 체인의 혼합 또는 직영 체인 방식에 ‘구성원 지분 투자’ 방식을 추가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디라오, 용가훠궈 등 수백 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다. 자본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분 투자할 수 없고, 해당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또는 파트너사여야만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기업 수익이 증가하면 일정 부분 함께 나누는 구조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의 전통적인 프랜차이즈와는 확연히 다르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이해관계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실제 지분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구조다. 이는 점포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훠궈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
중국 외식 브랜드 중 가장 익숙한 메뉴는 마라탕(麻辣燙)과 훠궈(火鍋)다. 특히 훠궈 전문 브랜드들은 대형 규모로 빠르게 점포 수를 늘려가고 있다. 각 브랜드는 차별화된 운영 및 제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이디라오(海底撈, Haidilao)는 1994년 쓰촨성(四川省, Sichuan) 젠양시(簡陽市, Jianyang)에서 론칭한 쓰촨식 훠궈 전문 브랜드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4개국 1,300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글로벌 매출은 8조원 내외다.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7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홍대점의 경우 991㎡ 규모에서 월평균 14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이디라오 의 경쟁력은 정통 훠궈와 함께 탁월한 서비스에 있다. 마라탕(麻辣湯), 삼선탕(三鮮湯), 버섯탕, 토마토탕 등 4가지 육수와 70여 가지 식재료, 6가지 소스를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유명하다. 특히 웨이팅 중 네일 서비스, 신발 닦기 등 세심한 배려와 면 뽑기 퍼포먼스 등으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한다.
용가훠궈(勇哥火鍋,Loonger Hot Pot)은 회전식 1인 훠궈 전문점을 콘셉트로 하고 있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치킨, 어묵, 각종 음료,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 등 총 100여 개의 식재료가 무한 제공되는데, 평일 점심 1만8900원, 평일 저녁과 주말 2만1900원의 가성비 가격이 특징이다.
용가훠궈(勇哥火鍋)의 강점은 본사의 막강한 바잉파워다. 웰리스 그룹(Wellis Group)은 중국 현지에서만 12개 브랜드, 2만5000개 직영점을 운영하며, 미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도 진출해 있다. 식자재를 대량 구입하므로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소스를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기에 비용 및 식재료 활용의 편의성까지 관리할 수 있다.
반티엔야오 카오위(半天妖烤魚, Ban Tian Yao Kao Yu)는 생선찜을 대표 메뉴로 내세우며 차별화하고 있다. 2014년 론칭 이후 중국 현지에서만 1,3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해외에는 2020년 명동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8개 직영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베트남 등에 10여 개 점포를 연이어 오픈했다.
반티엔야오는 닝보어와 청강어 중 하나의 생선을 선택한 후 마라, 마라곱창, 토마토, 쏸차이, 홍소버섯 등 원하는 맛의 마라 양념을 골라 주문하는 방식이다. 생선찜을 먹은 후에는 야채버섯모둠사리, 오리선지, 건두부 등의 재료를 훠궈처럼 함께 끓여 먹을 수 있다. 베트남 메콩강의 메기를 사용하며, 소스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받는다. 반티엔야오 홍대점은 264㎡ 규모에 월평균 매출 1억6000만원을 올리고 있다.
밀크티 브랜드의 양극화 전략
중국 밀크티 브랜드들도 훠궈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가성비를 내세운 대중형 브랜드와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고급형 브랜드로 양극화되어 있다.
미쉐빙청(Mixue)은 저가 밀크티 브랜드의 대명사다. 1997년 론칭한 이 브랜드는 전 세계 4만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중국 내 2만개, 동남아 1만개 내외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는 2022년 서울 흑석동 중앙대점을 첫 오픈했으며, 현재 1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미쉐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다. 총 30여 가지 메뉴가 모두 5,000원 이하로, 홍대점, 회기점, 고려대점, 성균관점, 중앙대점, 안양점 등 대학교 인근에 자리 잡으며 인지도를 넓혔다. 미쉐코리아 장진국 이사는 “한국의 식품 검사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기준을 통과하면 다른 어느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다”며 한국 시장 공략의 의미를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취향 차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과일차, 아이스크림, 밀크티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데, 한국에서는 아이스크림, 레몬워터, 흑당밀크티, 과일차 순으로 인기가 높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맛을 좋아하며 건강까지 함께 찾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기본 베이스와 잼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직접 들여오고, 차는 대만, 휘핑크림은 뉴질랜드, 우유는 한국 제품을 사용한다. 국내 매장의 월평균 매출은 5,000만원 내외다.

차백도(ChaPanda)는 ‘로컬, 신선, 건강’을 내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한다. 2008년 론칭한 이 브랜드는 중국 본토 8,300여 개, 해외 14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 홍콩증시 상장과 동시에 서울 강남점을 오픈하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후 태국, 호주,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도 점포를 오픈했고,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총 20개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
차백도의 차별화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식재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한 프리미엄 포지셔닝이다. 중국 현지에 대규모 식품과학기술 가공 기지 및 공급망 본부를 구축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 취향에 맞춘 제품을 빠르게 개발 및 출시하고 있다. 본사 직원 수 2,000여 명 중 연구개발 인원만 60여 명이며, 중국 본사에서는 매월 1~2개, 해외에서는 매주 신메뉴를 출시한다.
둘째,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이다. 차백도코리아 왕환 대표는 “전 세계 100여 개의 다양한 차 산지와 품종을 선별한 후 가장 뛰어난 풍미의 프리미엄 차 베이스를 사용한다. 또 제주 녹차나 한라봉, 수박 등 한국만의 로컬 식재료와 제철 과일을 적극 활용해 신선함과 건강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과일과 우유는 현지 제품을 사용하고, 공산품을 비롯한 주스 및 퓌레 등은 중국 공장에서 착즙한 후 급속 냉동해 들여온다. 메뉴 가격대는 3,900~6,900원이며, 국내 인기 메뉴는 ‘망고 포멜로 사고’, ‘소이빈 밀크티’, ‘타로볼 밀크티’다. 차백도 홍대점은 82㎡ 규모로 월평균 매출 1억8,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외식 브랜드의 또 다른 격전지
중국 외식 브랜드들의 글로벌 전략에서 베트남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동남아시아의 관문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진출의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디라오(海底撈, Haidilao)의 베트남 진출은 그 성공 사례를 잘 보여준다. 2019년 호찌민시 비텍스코타워(Bitexco Tower)에 1호점을 오픈한 하이디라오는 현재 호찌민시 10곳, 하노이 6곳, 냐짱 1곳 등 총 1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베트남 시장 매출은 8,780만달러(약 1,290억원)로, 싱가포르(1억5,890만달러), 미국(1억350만달러)에 이어 해외 시장 3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베트남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다. 2022년 7,540만달러, 2023년 7,800만달러, 2024년 8,780만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하이디라오 전체 해외 매출의 10% 이상을 베트남이 담당하고 있다. 하이디라오의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을 담당하는 슈퍼하이 인터내셔널(Super Hi Internation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하이디라오는 중국 외 시장에서 2,990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식사당 평균 매출은 25달러(약 64만동, VND)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베트남에서 하이디라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화 전략 덕분이다. 한국 지점에 비해 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베트남 물가에 맞춰 책정했지만, 서비스와 품질은 그대로 유지했다. 호찌민시의 주요 쇼핑몰과 랜드마크에 입점해 접근성을 높였고, 평일 저녁에도 예약이 필요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디라오의 시그니처인 소스 셀프바와 세심한 고객 서비스는 베트남 소비자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쉐빙청(蜜雪冰城, Mixue)은 베트남을 해외 진출의 첫 관문으로 삼았다. 2018년 9월 베트남 하노이(Ha Noi)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한 미쉐는 이를 발판으로 미얀마(Myanmar), 라오스(Lao),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 태국(Thailand), 말레이시아(Malaysia)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했다. 2023년 기준 동남아시아에서만 4,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해외 매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쉐(蜜雪冰城)의 동남아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중국과 가까워 원자재 수송이 편리하다. 둘째, 문화적 유사성이 높다. 셋째, 더운 기후에 차가운 밀크티가 잘 맞는다. 여기에 1,500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층을 공략하면서도 품질은 타협하지 않는 전략이 주효했다. 베트남에서 축적한 경험은 이후 한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의 밑거름이 되었다.
차지(霸王茶姬, Chagee)는 2017년 윈난성(雲南省, Yunnan)에서 설립된 이 프리미엄 밀크티 브랜드는 ‘동양의 스타벅스’를 표방하며 2019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월에는 중국 밀크티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차지는 호찌민시 1군에 첫 베트남 매장 개점을 준비했으나, 민감한 영역을 건드려서 베트남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베트남인들은 보이콧 운동을 전개했고, 개점 예정이었던 매장은 브랜드 간판을 검은색으로 가려버려야 했을 정도였다. 이 사건은 중국 브랜드들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시 정치적·외교적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한편 차지는 말레이시아에서 178개 매장을 운영하며 가장 성공적인 해외 시장을 구축했고,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본부로 삼아 2024년 재진출했다. 태국에도 진출해 있으며,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글로벌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은 1억명에 가까운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어 외식 브랜드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특히 젊은 인구 비율이 높고,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잘 작동하며, 외식 문화가 발달해 있어 중국 외식 브랜드들의 진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심히 살펴보고 벤치마킹만이 살길
중국 외식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은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다. 첫째, 중국 내 치열한 경쟁을 거쳐 검증된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갖춘 한국과 같은 시장을 먼저 공략해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셋째, 공동 지분형 직영 체인이라는 독특한 프랜차이즈 모델로 장기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넷째, 막강한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해외의 외식 브랜드들도 이들의 전략에서 배울 점이 많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조용히 성장하는 접근 방식,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모델, 그리고 디테일한 운영 시스템과 고객 경험 관리가 그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 외식 브랜드들의 성공 포인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국내 외식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