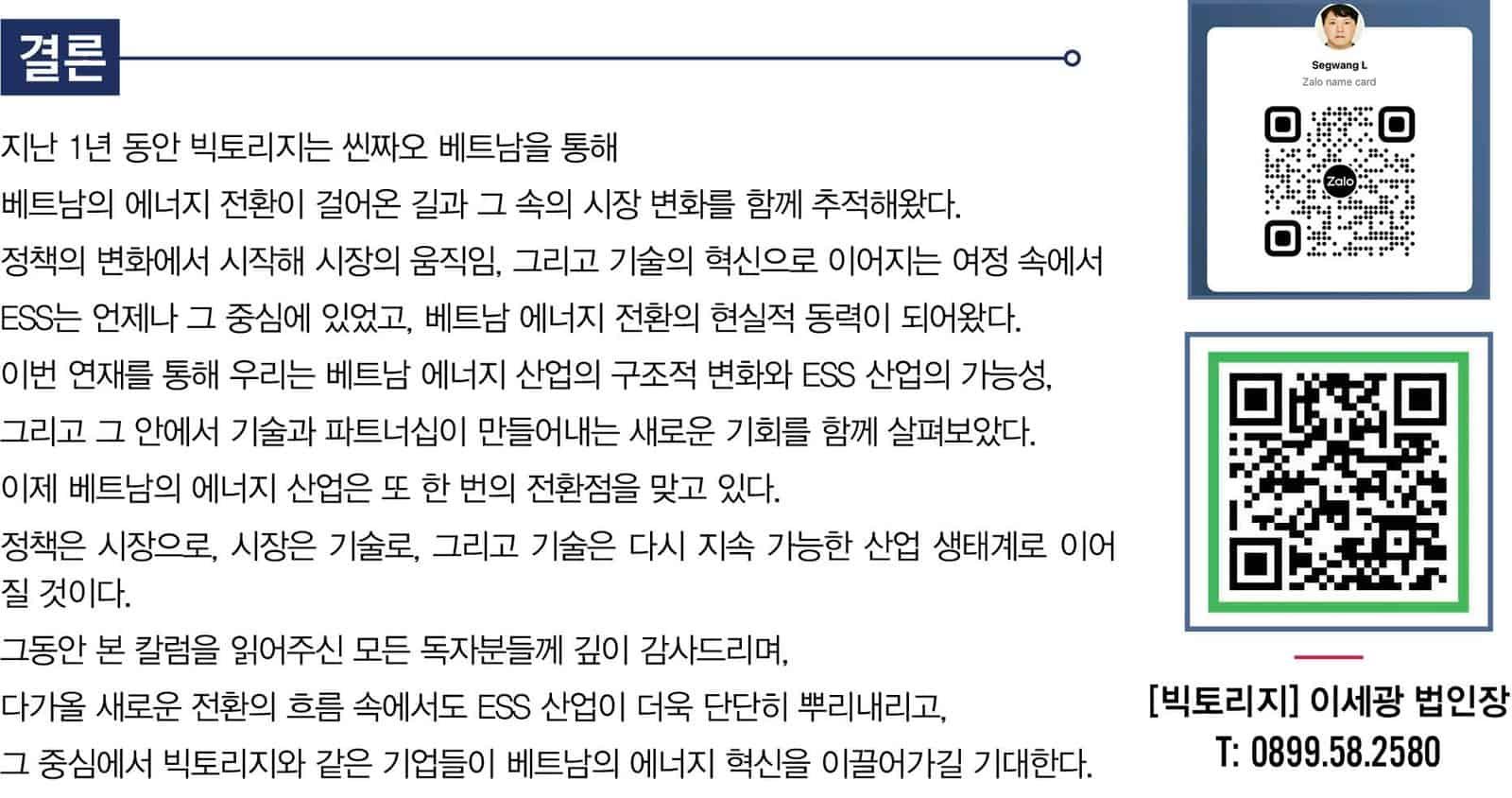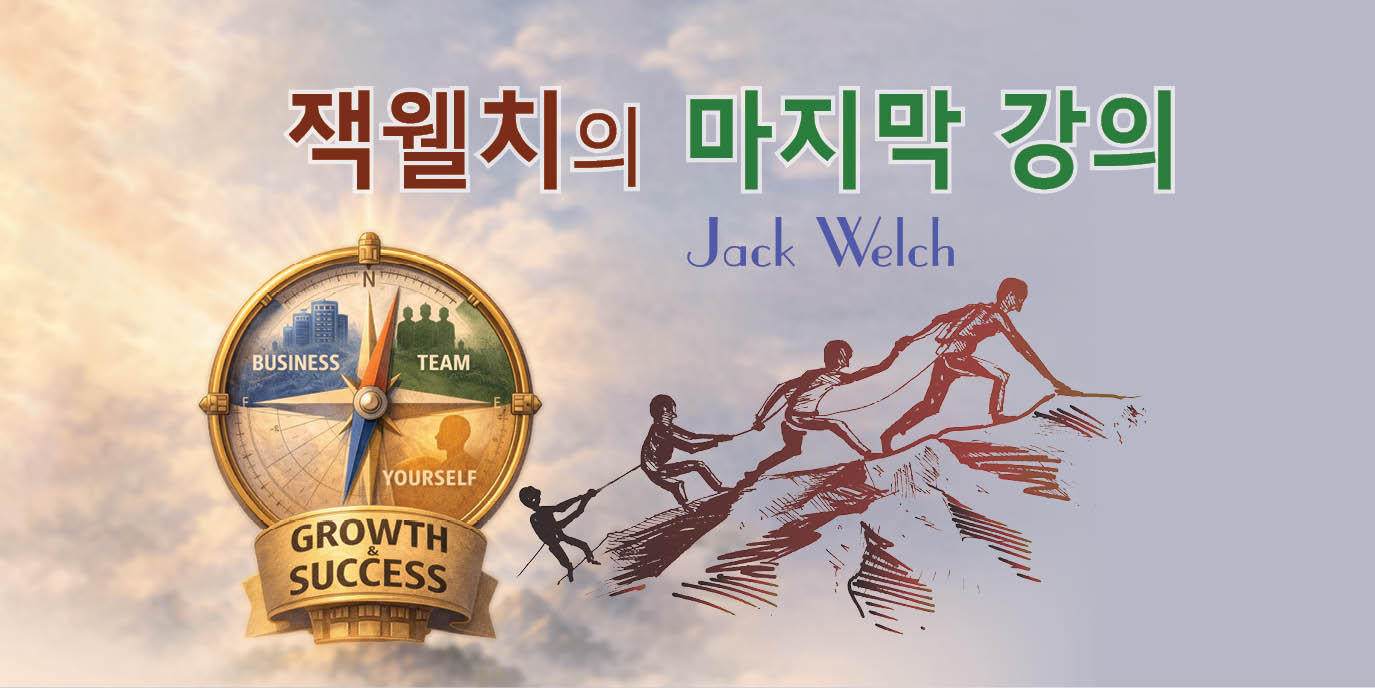ESS가 열어온 변화의 흐름을 마무리하며
1. 정책에서 실행으로, 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변곡점
그동안 본 칼럼은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력시장 변화를 중심으로,에너지 위기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현실 속에서 ESS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꾸준히 짚어왔다.
PDP8 개정안에서부터 직접전력거래제(DPPA), 그리고 법령 57/2025/ND-CP에 이르기까지,베트남 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정책이 실제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특히 지난 8월 체결된 한 – 베트남 재생에너지 협력 MOU는 양국이 에너지 전환을 산업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양국은 태양광·풍력·ESS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업 진출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베트남이 한국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이 한층 더 실행 중심의 단계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협력으로 구체화되는 실행, 진화하는 ESS 산업
정책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 시장과 기술이 그 실행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베트남의 전력시장은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참여형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옥상 태양광의 자가소비 확대, 민간 전력거래 제도화, 지역 단위의 계통 고도화는 모두 ESS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상업용,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요금이 동반 상승하면서, ESS는 에너지 자립과 비용 절감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자, 운영 효율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고도화되는 전력 안정화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베트남이 마주한 과제는, 구축된 ESS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이 요구하는 파트너의 기준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단순한 공급을 넘어 시스템 통합과 운영 최적화,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갖추고, 현지 환경을 이해하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한 – 베트남 재생에너지 협력 강화는 이러한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ESS 산업의 조기 도입과 운영을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베트남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결국 빅토리지와 같은 기업들이야말로, 검증된 시스템과 운영 기술, 그리고 협력형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에너지 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이끌 실행 중심의 핵심 주체로 자리할 것이다.